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완벽한 속도는 없을까. 미국 소설가 리처드 바크(Richard Bach, 1936~)의 [갈매기의 꿈]에서 ‘더 높이, 더 빨리’ 날려고 하는 갈매기 조너선에게 스승 치앙이 말한다.
“네가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앎으로써 시작하라(You must begin by knowing that you have already arrived).”
속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순간 더 높은 숫자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완벽한 속도에 다다를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세상은 우리 앞에서 즐거운 몸짓을 할 것이다. 머릿속의 시간 여행은 세상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는 마력을 발휘한다. ‘시작이 반’이란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인간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간다. 지금 바로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 그곳에 이미 도착해 있을 때 원하는 미래도 나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리처드 바크는 [영혼의 비행(Out of my mind)]에서 상상 속의 영국으로 날아가 꿈꾸고, 열망함으로써 가닿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린다.
짧은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시간 관리를 위해 편의상 시간을 임의로 정했다. 그 시간의 중심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그리니치에 있다.
왜 시간이 영국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너선의 ‘시간 날개’를 타고 가서 알아보자. 영국에서 시간 여행을 하다보면 리처드 바크처럼 ‘멋진 미래가 되기 위해 기다리는 과거의 소망’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 그리니치 천문대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가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지만,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뉴욕에서 런던까지 갈 수 있다. 조너선이 비행술을 익혀 ‘더 높이, 더 빨리’ 날면서 거리를 좁혔듯이 우리도 기술을 발달시켜 세상을 좁혀놓았다.
태양은 런던에서 뉴욕까지 5시간 만에 이동한다. 물론 실제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런던 사람들은 태양이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시계를 12시에 맞춘다. 태양이 대서양을 지나는 동안 런던의 모든 시계들이 째깍대다가 뉴욕 시간이 12시가 되면 런던 시간은 5시가 된다. 런던 시간이 뉴욕보다 5시간 빠르다.
북극과 남극을 잇는 지구의 세로선, 즉 경도는 영국 런던 교외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시작된다. 그 기준선이 0°이고 양쪽은 동경 180°, 서경 180°로 나뉜다. 시간도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흐른다. 그리니치의 지구 정반대편, 즉 경도 180° 지점에는 24시간의 절반인 12시간의 시차가 생기는데, 이 지점을 하루의 끝으로 정해 지도 위에 날짜 변경선을 그었다.
그런데 지도에 그려진 날짜 변경선을 보면 직선이 아니라 군데군데가 휘어진 모양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날짜 변경선을 꺾어 놓은 것이다. 날짜 변경선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어서 날짜가 바뀌는 불편을 겪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왜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와 시간의 기준이 되었을까? 1675년 영국 왕 찰스 2세는 천문 항해술을 연구하기 위해 런던의 교외인 그리니치에 천문대를 건립했다. 하지만 그리니치 천문대가 바로 세계에서 통용되는 경도의 기준점이 된 것은 아니었다.
신대륙 탐험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16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항해용 지도를 많이 제작했는데, 각자 자기 나라를 경도의 기준으로 잡아 지도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지구상의 같은 지점이라 해도 나라별로 경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84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만국 지도 회의’에 25개국의 대표가 모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25개국은 그리니치 천문대가 일찍부터 경․위도에 대해 연구해 온 성과를 인정했다.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을 경도 0°로 정하고, 시간의 기준도 같은 곳으로 채택하였다. 각 나라는 경도 15°마다 1시간의 시차를 두고 시간대를 정했다.
동경 124~132°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표준시 경선은 동경 135°다. 경도가 몇 도 차이 나는가를 알면 그 나라의 시간을 알 수 있다. 135를 15로 나누면 9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간은 경도 0°인 영국 런던보다 9시간이 빠르다.
런던 경찰관 보비도 다 모르는 런던의 거리
그리니치의 왕립 천문대가 우뚝 솟아 있는 언덕 아래에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 천문대 앞 월프 장군 동상 앞에 서면 구 왕립 해군학교 건물 뒤로 런던 시내가 그림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런던 시내에는 2층 버스가 자주 다니고 지하에는 ‘튜브(Tube)’라는 전철이 다닌다. 런던 지하철 역사(驛舍)의 통로는 좁고 촘촘하고 복잡하다. 마치 고성(古城)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기분이 들 정도다. 하지만 곳곳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런던의 수많은 길 중 리젠트 스트리트(Regent Street)와 본드 스트리트(Bond Street)는 쇼핑의 거리로 유명하다. 또 옥스퍼드 서커스(Oxford Circus)와 피커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cus)라는 유명한 곳도 있는데, 이곳에서 ‘서커스’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서커스’란 길이 교차하는 큰 광장을 의미한다.
과거에 영국의 마부는 대개 오른손에 채찍을 잡았다. 그래서 국왕이나 귀족을 마차에 태운 마부가 말에게 채찍질을 하려면 오른쪽에 앉아야 했다.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자동차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다. 그런데 좁은 영국의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하면 말에게 채찍질을 하다가 행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마차는 왼쪽으로 몰게 되었다. 이 습관도 그대로 남아 영국 도로에서는 차를 왼쪽으로 몬다.
런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보비(Bobby)’라는 애칭의 런던 경찰관도 런던의 길 이름을 전부 알 수는 없다. 런던 시내에 난 모든 길을 한 줄로 세우면 지구 한 바퀴나 된다고 한다.
런던의 랜드마크, 타워 브리지와 런던 탑
런던 시내를 가로지르는 템스 강에는 단연 눈에 띄는 다리가 있다. 바로 타워 브리지(Tower Bridge)이다. 런던 탑(Tower of London) 근처에 있기 때문에 타워 브리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큰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열리는 도개교(跳開橋)와 케이블로 다리를 지지하는 현수교(懸垂橋)가 결합된 구조로 이뤄져 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조명을 받으면 하얗게 빛나는 타워 브리지의 야경은 장관을 이룬다.
도개교를 매단 높이 50m의 두 탑은 런던 탑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 다리 가운데가 분리되어 거의 90도 가까이 들려지면 구경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몸이 함께 들려지기라도 하듯 용을 쓰게 된다.
런던 탑은 노르만의 정복왕 윌리엄 1세가 1066년 건설하기 시작했고, 13세기 에드워드 1세 무렵 현재의 모습이 갖춰졌다. 17세기 제임스 1세 때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었지만 왕족이나 죄인을 유폐하는 감옥이나 처형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은 오랜 옛날의 진기한 물건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078년 윌리엄 1세가 세운 중앙의 주요 건물 화이트 타워(White Tower)에는 전투용 갑옷이나 무기는 물론 개가 입는 철갑옷과 죄수의 머리를 자르는 단두대도 전시되어 있다. 탑 북쪽에 있는 주얼 하우스(Jewel House)에는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 만든 530캐럿의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의 별(The Great Star of Africa)’이 있다.
국회 의사당과 버킹엄 궁전의 공존
템스 강가에 있는 영국의 국회 의사당(Houses of Parliament)은 타워 브리지와 함께 런던의 랜드마크로 꼽힌다. 방은 1,000여개에 달하고 복도 길이는 약 3.2km다. 중앙 로비 북쪽의 하원 의사당과 남쪽의 상원 의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국회 의사당에는 둥근 지붕 대신 네모난 탑들이 있는데, ‘빅 벤(Big Ben)’이라는 큰 종이 달린 시계탑은 시간을 알려 준다.
영국의 의회는 이론상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원인 평민회(House of Commons)와 귀족 및 왕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인 귀족회(House of Lords)로 이뤄져 있다. 1295년 에드워드 1세는 과세의 필요성 때문에 모범 의회를 열어 각 신분 대표를 소집했다. 이후 귀족들은 귀족원을, 중산층 대표들은 시민원을 따로 형성했는데, 각각 상원과 하원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의 상원은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하원이 결의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는 버킹엄 궁전(Buckingham Palace)이 있다. 1703년 버킹엄 공작이 지은 버킹엄 하우스를 1761년 조지 3세가 매수한 이후 조지 4세가 건축가 존 내시를 기용해 개축했다. 현재 왕실의 사무실과 주거지로 쓰이고 있다. 버킹엄 궁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한 근위병 교대식이 거행된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근위병 교대식을 보려고 모여들기 때문에 보비들이 차량과 인파를 통제한다.
서민과 함께 한 ‘세인트 폴’, 왕족과 함께한 ‘웨스트민스터’
런던에는 미국 국회 의사당처럼 둥근 지붕을 얹은 큰 건물이 있다. 바로 세인트 폴 대성당(Saint Paul’s Cathedral)이다. 워싱턴 국회 의사당의 둥근 지붕은 이 성당의 지붕을 본떠 만든 것이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미국이 건국된 해인 1776년보다 66년이나 앞선 1710년에 완공된 건물이다.
1666년 런던에 대규모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다. 666이 마치 불길이 치솟는 모습 같지 않은가. 대성당을 비롯한 도시 대부분이 타버려 런던 대화재라고 부른다. 그때 ‘굴뚝새’를 의미하는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 1632~1723)’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잿더미로 변한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렌은 아름다운 성당을 비롯해 다양한 건축물을 지었다. 현재의 세인트 폴 대성당 역시 화재가 일어난 후 렌이 재건한 건축물이다.
렌은 런던에 성당을 여러 개 지었는데, 대부분의 성당에 특정한 모양의 첨탑을 세웠다. 지금도 건축가들이 ‘렌의 첨탑’을 본떠서 성당을 짓고 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이 서민들의 성당으로 유명하다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영국 왕실의 대관식이나 결혼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렌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Westminster Abbey)이라는 아주 오래된 성공회 성당도 재건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성당일 뿐 아니라 역대 왕을 비롯해 올리버 크롬웰,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등 유명한 인물들이 묻힌 묘지이기도 하다. 시인의 공간(Poets’ Corner)에는 제프리 초서, 에드먼드 스펜서, 알프레드 테니슨, 로버트 브라우닝, 찰스 디킨스, 토머스 하디 등이 안치되어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1892)의 시구를 떠올려 본다.
죽은 뒤 생각나는 키스처럼 다정하고
이젠 남의 것이 된 입술 위에
속절없이 시늉만 해보는 입맞춤처럼 감미로워라,
사랑처럼 깊어라, 첫사랑처럼 깊어라
뉘우침만이 사무치는구나
오, 삶 가운데 죽음이어라, 가버린 날들은! - [세계의 명시], 리베르, 2004
테니슨에게 가버린 날들은 ‘살아 있는 죽음’이나 다름없다. 과거는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슬픔의 심연 속으로 몰아넣는 아픈 시간이다. 테니슨의 시 [눈물, 부질없는 눈물]이 성당의 영혼들을 불러일으켜 흘려버린 ‘가버린 날들’ 속으로 다시금 몰아넣을 것 같다.
윈저 성과 카디프 성에 홀리다
런던에서 서쪽으로 35km 정도 가면 아직도 사람이 거주하는 성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윈저 성(Windsor Castle)이 템스 강변 언덕 위에서 웅대한 모습을 드러낸다. 중앙의 거대한 원형 탑 좌우로 마치 날개를 활짝 편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가파른 경사지에 자리해 있어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강 건너편에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이튼 칼리지(Eton College)가 숲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윈저 성은 1066년 정복왕 윌리엄 1세가 세운 목조 요새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수세기에 걸쳐 증·개축되었다. 오늘날의 성은 주로 건축가 제프리 와이트빌(Jeffry Wyatville) 경이 1820년대에 조지 4세를 위해 낭만적인 성으로 개조한 것이다. 윈저 성은 런던의 버킹엄 궁전, 에든버러의 홀리루드하우스 궁전(The Palace of Holyroodhouse)과 함께 영국 왕실의 공식 거주지에 속한다.
런던에서 버스를 타고 세 시간 정도 가면 웨일스의 수도 카디프에 도착한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카디프 성(Cardiff Castle)은 로마 시대 요새의 모습과 빅토리아조의 고딕 양식이 어우러져 위압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여준다.
성의 부지에 있는 뷰트 후작의 저택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설레게 한다. 화려하고 낭만적인 중세풍의 저택에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것 같다. 19세기 중반 이 저택을 설계한 윌리엄 버지스(William Burges, 1827~1881년)는 “13세기의 믿음 속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중세에 매혹되어 있었다.
누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했나. 중세 영국의 성만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유적이 또 있을까. 테니슨은 ‘가버린 날’들에 대한 상념에 빠졌지만, 버지스는 ‘가버린 날’들을 훌륭하게 재현해냈다.
자부심 강한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웨일스는 잉글랜드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반도다. 현재 영국에 속하지만 예전에는 독립된 나라였다. 1282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를 정복한 후 원주민을 달래기 위해 웨일스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통치자로 보내 주기로 약속했다. 웨일스 사람들은 왕의 약속을 듣고 기뻐했다.
왕에게는 웨일스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아기라서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아들이 있었다. 왕은 이 아기를 웨일스의 통치자로 정하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Prince of Wales)’라고 불렀다. 그 후 장차 대를 이을 영국 왕의 장남을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웨일스는 18세기 중엽 산업 혁명에 힘입어 부를 쌓았다. 수도인 카디프는 석탄과 철의 수출 및 조선 공업지로 유명하다. 20세기 들어서는 웨일스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잉글랜드 북쪽에는 스코틀랜드가 있다. 오현제(五賢帝) 중의 한 명인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스코틀랜드 원주민 픽트 족의 침입으로부터 속주 잉글랜드를 지키기 위해 장성을 쌓았다. 이 장성이 없었다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분열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후 픽트 족은 스코트 족에 동화되었는데, 이 스코트 족의 이름에서 스코틀랜드가 유래했다.
스코틀랜드는 골프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코스가 있다. 골프는 14세기경 네덜란드의 ‘콜벤(Kolven)’이라는 하키 비슷한 놀이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변화된 것이라는 설, 스코틀랜드에서 목동들이 나뭇가지로 돌멩이를 날리던 민속놀이가 골프로 발전했다는 설 등이 있다.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모래 언덕 등 골프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연조건이 잘 갖춰져 있었고, 골프채의 원재료가 되는 나무도 풍부했다. 이런 이유로 골프가 스코틀랜드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상징으로는 킬트와 백파이프를 빼놓을 수 없다. 과거 스코틀랜드 남자는 밝은 색의 정사각형 숄을 걸치고 반바지 대신 무릎까지 내려오는 킬트라는 치마를 입었다. 킬트의 패턴과 색은 그들의 가문 또는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스코틀랜드에는 백파이프라는 특이한 악기가 있다. 돼지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풍선처럼 바람을 불어넣는 파이프가 달려 있고, 몇 개의 소리관이 연결되어 있는 관악기다. 연주자는 팔 밑에 주머니를 끼운 채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팔로 눌러 바람을 빼내 소리관에서 소리가 나오게 한다.
스코틀랜드 서쪽 클라이드 강 유역에 있는 도시 글래스고는 그레이트브리튼 섬에서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이지만,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동쪽 해안에 있는 에든버러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에든버러 성(Edinburgh Castle)에 올라가면 에든버러 시내가 사방으로 내려다보인다.
성의 대연회장에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상징하는 ‘운명의 돌(The Stone of Destiny)’이 보관되어 있다. 과거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사람은 대관식 때 운명의 돌 위에서 무릎을 꿇고 왕관을 받았다. 1296년 에드워드 1세가 빼앗아 간 ‘운명의 돌’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대관식 때는 다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으로 1996년에 반환되었다.
에메랄드 섬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수도 더블린을 조금만 벗어나도 넓은 목초지가 펼쳐진다.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늘 푸른빛을 선명하게 띤다. 그래서 에메랄드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아일랜드 섬 남부 지역은 독립 후 나라 이름을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of Ireland)’이라고 정했다. 아일랜드 섬의 북동부에 있는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의 영토지만 가톨릭교도가 독립을 주장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신교(新敎) 국가인 잉글랜드는 12세기부터 부분적으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삼았고, 17세기부터는 전 국토를 식민지로 통치하였다. 이때 잉글랜드는 구교(舊敎) 국가인 아일랜드에 신교도를 이주시켰는데, 이때부터 종교 갈등과 민족 대립이 시작되었다.
북아일랜드에는 스코틀랜드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인이 여인을 아일랜드로 데려오기 위해 마법의 다리를 놓았다는 전설이 있다. 실제로 북아일랜드 북쪽 해안에는 바다로 뻗어 나가는 듯한 돌기둥 수만 개가 있다. 이 돌기둥들을 ‘거인의 둑길(Giant’s Causeway)’이라고 부른다.
이 마법의 다리는 수천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용암이 차가운 바다와 만나 식으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를 주상 절리라고 하는데, 제주도 남부 해변에서도 볼 수 있다.
용암처럼 뜨거운 열정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정이다. 바다의 차가움이 만들어낸 ‘거인의 둑길’이 테니슨의 눈물 어린 ‘가버린 날’을 되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자연처럼 인간 세계에서도 냉정과 열정이 양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리처드 바크가 영국에서 찾은 열망의 세상도 냉정과 열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공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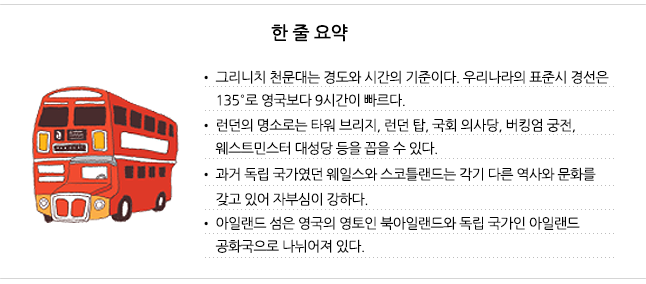
네이버 포스트 [이 나라의 랭킹, 순위가 궁금해] 런던에서 가장 붐비는 역 Best 5
출 처 : 런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World Geography > World Geograph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럽 연합 (0) | 2015.07.31 |
|---|---|
| 영국의 역사와 지리 (0) | 2015.07.31 |
| 프랑스의 역사와 지리 (0) | 2015.07.31 |
| 파리, 베르사유, 몽생미셸 (0) | 2015.07.31 |
| 크로아티아 (0) | 2015.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