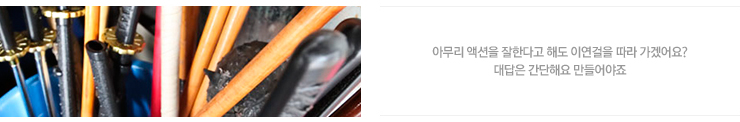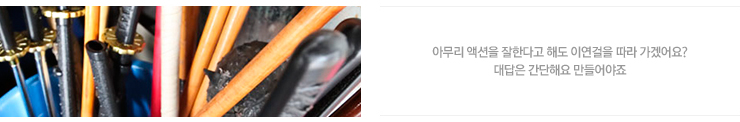|
그의 20년 액션 인생은 한국영화의 질곡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 “처음엔 정말 멋모르고 덤볐죠. 외국영화 보면 화려하잖아요. 액션 장면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뛸 정도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물불 안 가리고 뛰었는데, 결과물을 보면 템포도 떨어지고 리얼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 한국영화는 액션 스타일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에, 각목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체기였죠.” 이때 그는 <런어웨이>(95)로 김성수 감독을 만났고, <비트> 때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잡고 뷰파인더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태양은 없다>(99)에선 권투 액션을 시도했다.
김지운 감독과의 만남도 큰 인연이자 기회였다. <반칙왕>(00)에서 레슬링 액션에 도전했던 그는 <달콤한 인생>(05)에서 놀라운 액션 장면의 산파가 된다. “<달콤한 인생> 액션 신은 외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도 꽤 들어왔고요. 사실 액션만 놓고 보면, 제가 과거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각목 휘두르고, 창고가 공간이고, 일대다로 싸우니까요. 그런데 액션을 담는 그릇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액션 지기’ 류승완 감독과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다. “류승완 감독은 홍콩 영화를 좋아하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둘이 부딪히는 지점이 생겼어요. 관객들도 인정해주실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약간은 새로운 스타일의 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재미가 있든 없든, 한국적 액션의 색깔이라는 게 생긴 거죠.” 스턴트가 천시 당하는 풍토 속에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액션에 대한 열정을 지녔던 감독들과 주로 작업한 덕분인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극단적인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그 감독님들 덕분에 덤으로 칭찬을 받으면서 온 거죠.” 그리고 그의 곁엔 ‘서울액션스쿨’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