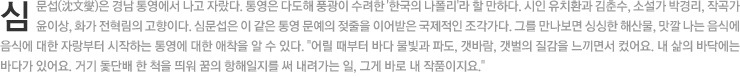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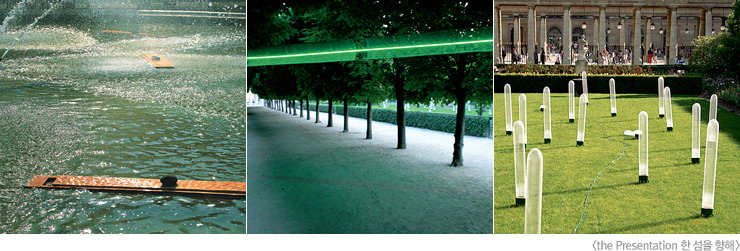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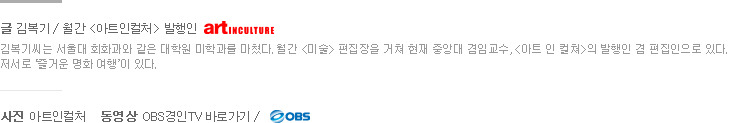
'Living daily > 한 국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가 황두진 (0) | 2009.02.02 |
|---|---|
| 탁구선수 이에리사 (0) | 2009.01.30 |
| 영화감독 이명세 (0) | 2009.01.28 |
| 대장암 수술의 권위 유창식교소 (0) | 2009.01.28 |
| 건축가 장윤규 (0) | 2009.01.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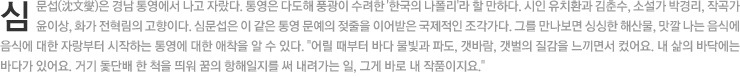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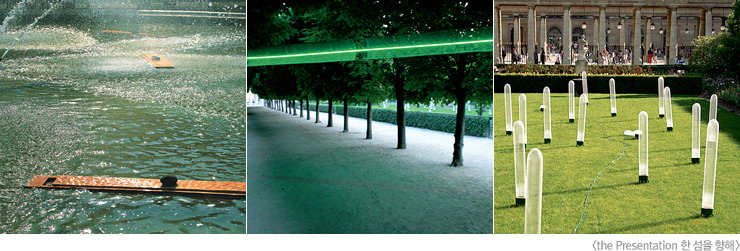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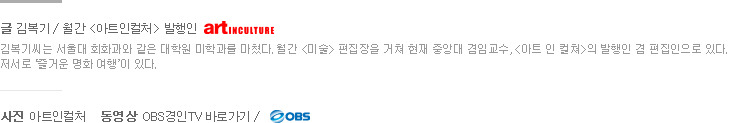
| 건축가 황두진 (0) | 2009.02.02 |
|---|---|
| 탁구선수 이에리사 (0) | 2009.01.30 |
| 영화감독 이명세 (0) | 2009.01.28 |
| 대장암 수술의 권위 유창식교소 (0) | 2009.01.28 |
| 건축가 장윤규 (0) | 200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