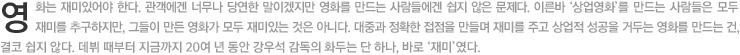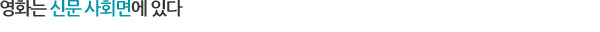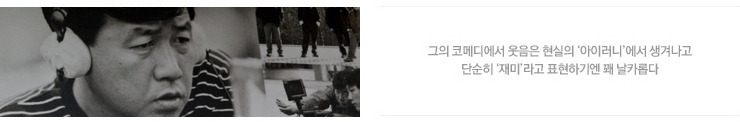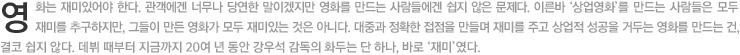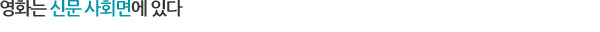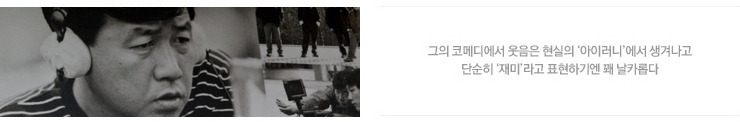|
강우석 감독은 꽤 일찍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에 매혹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영화란 영화는 다 보셨던 분”이었고, 그 또한 거의 극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국적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영화들을 접했다. 중학교 시절에 영화감독을 동경하기 시작했던 그는, 고등학생이 되어선 장차 감독이 될 거라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였다. 요즘 같으면 ‘유망 직종’일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에 ‘영화감독’을 꿈꾼다는 건 어른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결국 집안의 반대로 연극영화과 진학은 포기해야 했다. “요즘 현장에서 영화과 나온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20대 초반, 그 젊은 시절부터 영화를 찍을 수 있었을 테니까.”
영문학과를 선택하긴 했지만, ‘영화 찍는 일’에 대한 그의 열망은 여전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을 본 후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2학년 때 대학을 중퇴하고 현장으로 간다. “그때 대학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내가 과연 영화감독이 될 수 있었을지 궁금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충무로에 왔다면, 그래서 연출부 일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을지……” 1980년대 충무로 연출부 생활은 쉽지 않았다. (지금은 없어진) 영화진흥공사에서 나오던 <영화>라는 월간지에 번역 연재를 하고, 틈 나는 대로 영화 자막 번역 일을 하기도 했다(<아마데우스>의 한국 극장용 자막은 강우석 감독의 솜씨다). 너무 힘들 땐 복학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그때(조감독 시절) 네 걱정 많이 했다고.(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