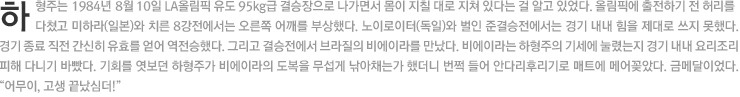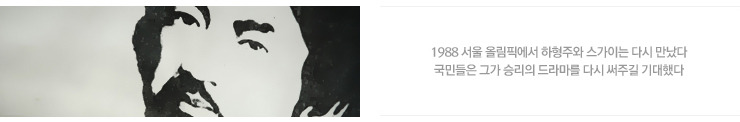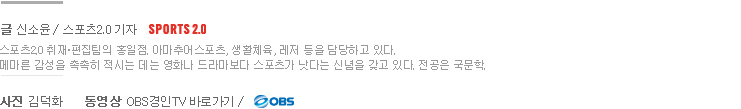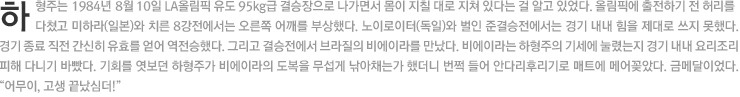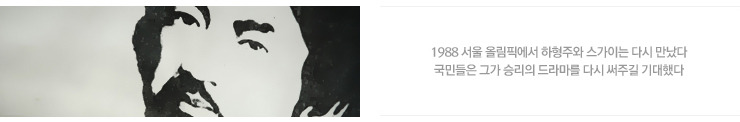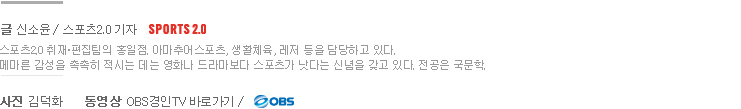|
메달의 부푼 꿈을 안고 LA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기수는 하형주였다. 기수는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얼굴로 메달 획득이 유력한 선수가 맡곤 한다. 하형주는 LA올림픽을 앞두고 출전한 1981년 아시아선수권대회, 1981년 세계선수권대회, 1983년 범태평양선수권대회 등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메달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시원스런 이목구비와 짙은 눈썹, 듬직한 체격 등 외모도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1984년 LA올림픽은 어느 올림픽보다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회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직전 대회였으며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을 건너뛰고 8년 만에 출전하는 대회였기 때문이다. 옛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불참한 모스크바 대회에 이어 또다시 치러진 ‘반쪽 대회’였던 만큼 이전 대회들보다 메달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실제로 한국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2kg급 김원기가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을 딴 것을 시작으로 금 6, 은 6, 동메달 7개의 역대 최고성적을 올리며 금메달 기준 종합 10위 안에 들었다. 체력이 곧 국력이었던 시절, 국민들은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 된 것만큼이나 기뻐했다. 모든 메달이 극적이었지만 6개의 금메달 가운데 특히 불굴의 투지를 보인 하형주의 경기는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다. 2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지만 하형주를 응원했던 이들은 아직도 당시 바짝바짝 타들어 갔던 입술의 감촉을 기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