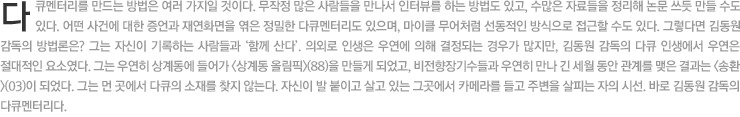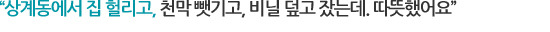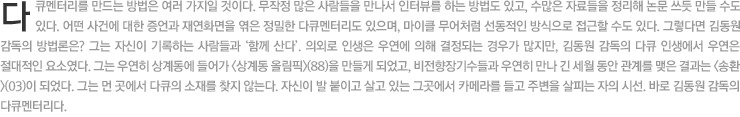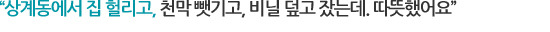|
지난 20여 년 동안, 그의 ‘작업 환경’이 결코 좋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정치적 이유로 네 번 정도 연행되기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컸느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살면서 겪는 수준 정도? 연행 당했을 때도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것도 상계동에서 배운 건데, 마주치기 전까지는 두려워도 실제로 맞닥뜨리면 그 두려움은 해소가 되거든요. 상계동에서 집을 헐리고 천막 생활을 했을 때, 천막도 빼앗아간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실제로 천막을 털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비닐 덮고 자는 게 그렇게 따뜻한지 알게 되었고.(웃음)”
다큐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고민이다. 그것이 다큐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 또 고통이기도 하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할 권리가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포기하면, 다큐적 ‘재미’가 없어져요, 저는 어쩌면 운이 좋았죠.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마 작품을 하려는 의도로 만났다면 부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주변의 잘 아는 사람을 찍다가 작품으로 이어졌기에, 그런 딜레마는 거의 없었던 셈이죠.” 하지만 ‘자연인 김동원’이 아닌 ‘다큐 감독 김동원’이기가 힘들 때도 있다 “송환 당일, 할아버지들이 떠나시는데, 마지막 이별을 해야 하는데,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했죠. 카메라를 내팽개치고 싶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다큐도 그런 이유로 접었다. 어머니를 통해 해방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환기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 “어렵게 승낙을 받아서 한 번 촬영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젝트를 접었어요. 다큐는 대상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큐 감독 김동원’은 포기해도, 아들로서 ‘자연인 김동원’은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