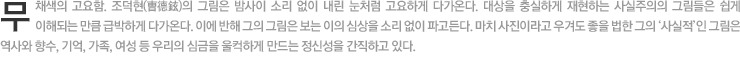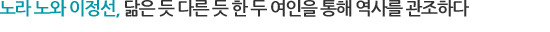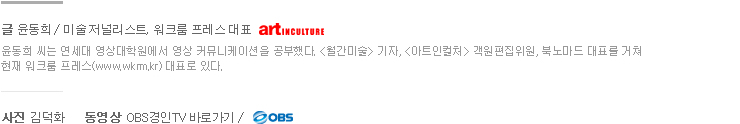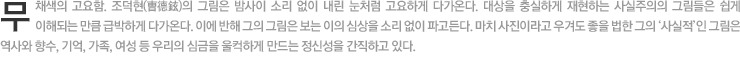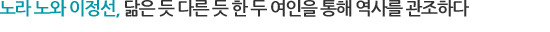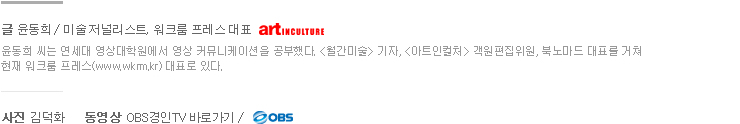|
조덕현은 연필과 콩테의 드로잉만으로 작품을 일구어낸다. 좀 더 압축해서 말한다면 한국 가족의 낡고 빛바랜 사진에 기초한 ‘추억’을 그린다. 너무도 똑같아서, 그래서 가끔은 섬뜩하게 다가오는 ‘사실적’인 그림이다. 이를 통해 그는 한 개인의 소소한 일상의 삶을 담아내고, 나아가 그의 영육(靈肉)을 관통해온 시간과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조덕현은 한국 여성의 삶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업을 페미니즘이라는 시선으로 묶어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1991년 딸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그것도 한국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인생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림의 소재로 여성을 다루면서 바느질과 천이라는 재료도 사용해 보았어요. 하지만 한국 여성의 삶을 화폭에 담는 동안 여성사, 그리고 여성의 문제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덕현의 그림을 여성이라는 화두로 뭉뚱그려 정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다. 한 개인의 미시사를 통해 역사라는 거대 서사를 조망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게 옳겠다. 조덕현의 그림이 매력적인 까닭은 역사라는 거대한 시대 흐름 속에 제외되거나 소외되었던 개인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지나간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역사라는 이름의 지나온 시간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연필과 콩테로 누군가의 옛 사진을 재현하다보니 역사라는 이름의 거대 서사의 기록에서 빠진 부분이 보이더군요. 완벽하다고 여겨졌던 역사의 몸통에 숭숭 뚫린 구멍을 발견했다고 할까요. 화가인 내가 바로 그 빈틈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 작업을 통해 한 개인의 잊혀진 기억을 복원하고, 동시에 삶의 풍부한 정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